지난해 12월 17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날씨마저 꽁꽁 얼어붙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하필 왜 이렇게 추운 날 취재하러 왔어. 기자 양반도 참…." 전승호(59)씨는 빨갛게 얼어붙은 기자의 양손을 감싸 쥐더니 이내 어시장 입구의 ‘찻집(노점상)’으로 달려가 뜨거운 커피를 내왔다.

"경기, 뭐 경기랄 것도 없어. IMF(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못해. 최악이야."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형제수산의 주요 거래 품목인 곰치·물메기·아귀·갈치 등의 주문이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반토막을 넘어 매출이 70%까지 급감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전엔 하루에 생물·냉동 다 합쳐서 100궤짝씩 팔려 나갔는데 ‘세월호·메르스·최순실’ 사태를 연달아 겪으면서 요새는 30궤짝밖에 못해. 상권이 너무 죽어서 빨리 이전해야 돼."
인천종합어시장은 1981년 10월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일원 7천여㎡의 터에 점포 수 500여 개를 갖춰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무수한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는 곳곳이 낡고 빛이 바랬다.
그런데 얼마 전 인천시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로의 이전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놔 전 씨를 비롯한 1천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 있다.
"이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한 20년 전쯤 돼 가. 이번에는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갔었는데 비전과 전망이 정말 좋더라고. 다만 끝까지 정말 해낼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옮겨서 새로 지으려면 부지도 여기의 3배 이상은 돼야 하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런데 외지인들이 항상 여기 와서 물건을 사면 바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거든. 그럴 땐 정말 답이 없어. 어시장인데 사실 바다가 안 보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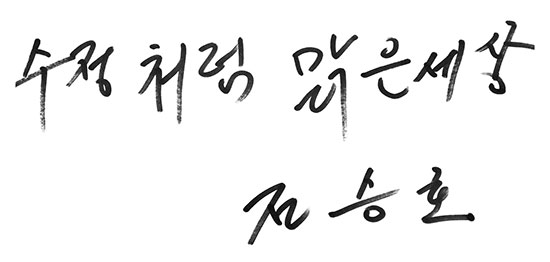
"서울 노량진, 부산 자갈치, 마산, 목포, 강릉 주문진, 전국 어시장을 다 가 봤지만 여기만큼 규모가 크고 창고와 공판장, 경매장을 두루 잘 갖춘 데는 못 찾겠더라고. 도·소매가 다 되는 데다 바다만 없어서 그렇지 여기야말로 아시아 최대의 수산물 시장 아니겠어?"
그런 그도 정유년(丁酉年)에는 공자가 말한 ‘이순(耳順)’을 맞이한다. 세상사 이치야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나이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예전 같지가 않다.
"100세 시대에 환갑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만약 이전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같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야. 여기 점포들 중 2∼3세대가 운영하는 데가 제법 많거든. 그러려면 우선 어시장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해."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우리네 일과가 꼭두새벽에 시작해 한낮이면 끝나는데 요새는 텔레비전을 안 봐.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켜기조차 싫은 거지. 바닥(서민층)엔 비리가 없는데 항상 윗놈들이 문제야. 여기서 더 나빠져선 안 돼. 척결할 것은 이번 기회에 깨끗히 척결하고 가야 해.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윗사람들’에 대한 전 씨의 날선 지적이 선거철이면 이곳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정치인들에게 ‘대오각성의 일갈’이 될지,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를 그는 웃으며 또 한 번 던졌다.
글·사진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