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속한 폭우가 지나가니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진다. 무덥다 못해 무서울 정도다.
옆 동네 광주시만 가도 체감 정도는 다르다. 빽빽한 도시와 다르게 어느 곳을 향하더라도 푸른 숲이 보이는 덕분이겠다. 이상기후로 뒤덮인 도심의 열기가 푸르름의 소중함을 말하는 듯하다.
이렇듯 자연녹지를 보존하고자 지자체마다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속속 개발(완공)한다.
광주시 쌍령공원도 2022년 협약을 맺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민간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자원이 부족한 공공 대신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 으로 일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총면적 51만여㎡ 가운데 40만여㎡를 공원시설로, 나머지 11만㎡에는 2개 단지 2천300여 가구가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1조 원을 넘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인 ㈜쌍령파크개발이 공동시행자다.
공공의 녹지를 확보한다는 의도지만 사실상 개발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대가로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아파트 부지를 제공받아 개발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특례사업을 벌이는 지자체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쌍령공원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선정부터 시의회의 특혜 논란에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도 아니었고 수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제도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고양시 탄현·토당근린공원 등은 공공 주도 방식을 택하고 시와 주민 등이 3자 협의체로 참여해 공공성을 높인 사례다. 이천시 부악공원은 수익률 10% 이내로 제한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쌍령공원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다. 앞서 이 업체(자회사 포함)에 전직 고위 공무원 다수가 재취업했다는 점이다. 알려진 출신만 해도 전 사업전략본부장 A씨, 전 총무국장 B씨, 전 산림과장 C씨에 이어 광주경찰서 과장 출신의 D씨다. 물론 퇴직자가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간부 출신들이 지역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는 게 현직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특히 A씨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현직 시절 민간특례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퇴직 후에는 이 업체에 재취업해 유착 관계를 이어 간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2021년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9천5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퇴직 후에는 이 업체에서 월급여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공공의 권한을 민간 기업에 넘겨 주고 대가를 챙긴 전형적인 ‘관피아 카르텔’의 양상이다.
여기에 이 업체는 억대의 금액을 주고 지역언론을 인수, 이 사업을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수십 차례 보도하며 여론을 적극 주도했다는 의심도 산다.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민간, 언론의 삼각 유착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공무원 출신의 장점을 살려 행정사 자격으로 자문이나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됐다면 적어도 법이나 회계 투명성이라는 최소한의 외형은 갖췄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가려는 모습은 현직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고, 의심받을 곳에 있지 말고, 외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의심받을 행동은 애초부터 삼가라는 경계다.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섰는지 아닌지를 묻는 목소리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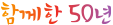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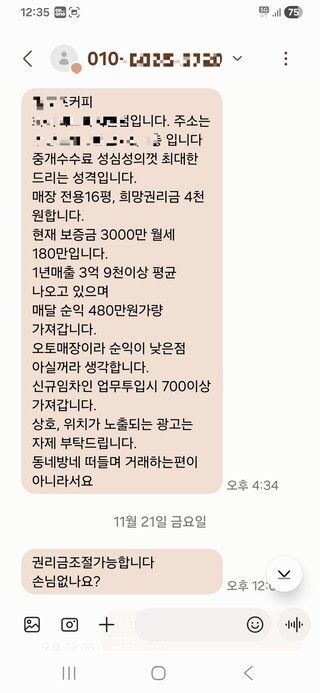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