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18대 임금 현종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일갈했다. "임금에게 박하고 누구에게 후하단 말인가." 1674년, 조선왕조를 통틀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던 2차 예송(禮訟)논쟁의 와중이었다. 당파 간 정쟁은 점차 격해지고, 당론이 국론을 앞서 가기 시작하던 때였다. 현종이 지적한 ‘누구’는 서인 노론의 거목이자 그 세력이 임금을 능가할 정도였던 우암 송시열(1607~89)이다. 왕과 신하, 신하들 간 정쟁은 더 심해졌고, 숙종대에 이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백 명씩 귀양을 가거나 죽어 나가기 일쑤였다.
"내 죽어 내 뼈가 한줌 재가 될지라도/ 이내 한은 정녕 사라지지 않으리라/ 내 살아 백번이나 윤회한다 하더라도/ 이내 한은 응당 오래도록 온전하리라 (중략)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태고로 돌아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연기처럼 된다해도/ 이내 한은 맺히고 다시금 맺히리니/ 이 괴로움 한 덩이로 갈무리해 두었다가/ 토해 내어 삼천대천에 가득 채울 것이오…"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가 자결한 부인을 위해 쓴 시 ‘도망(悼亡)’이다.
1755년 나주에서 괘서사건(을해옥사)이 터졌다. 피바람이 휘몰아쳤다. 영조와 노론에 의해 소론(少論) 세력이 거의 절멸되다시피 했다. 원교체로 유명한 서예가요 정치가, 강화학파 학자이자 당색으로는 소론이었던 이광사는 연좌제에 걸려 고문을 받은 뒤 유배됐다. 부인은 남편이 옥사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귀양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쓴 시다. ‘처절함’이나 ‘피울음’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절규. 그는 이 일로 20여 년간 유배지를 전전하다 쓸쓸히 죽음을 맞는다. 「연려실기술」로 유명한 이긍익이 그의 아들이다.
이렇듯 정쟁은 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물론 국가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정과 가문을 풍비박산 냈다. 삼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성인 남자의 씨를 남겨 두지 않았다. 한은 대를 이어 쌓이고, 복수는 되풀이될수록 참혹함이 더해졌다. 나라와 백성보다 자신의 당과 나의 권력, 명분,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상대의 숨통까지 끊는 정쟁이 200여 년간 지속됐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자리할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는가?
당파 간 정쟁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 당쟁은 정체성(停滯性)론, 타율성(他律性)론과 함께 일제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로 끌어다 꿰맞춘 식민사관의 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조화와 균형, 협력과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이와 비슷한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곤 한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작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국가도, 국민도 없다. 입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외치지만 당리당략이 최우선이다. 하는 일이라곤 모략과 중상과 싸움이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고성과 욕설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특권을 보면 가히 기가 막힐 정도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 바람이 거세다. 인천에서 시발된 그 열풍이 차츰 정치권과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정치체제 개편을 위한 노력은 그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 3월 12일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소명의식을 갖고 개헌 추진의 최일선 동력이 되도록 인천시민들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가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된 책임의 절반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민흥무사특(民興無邪慝), ‘국민이 정신 차리면 나라에 간사하고 속이는 무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치는 대오각성하고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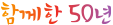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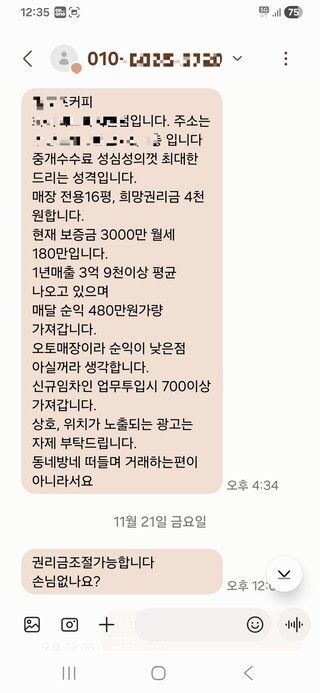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