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崔在亨, 1858~1920)은 러시아 연해주 일대 독립운동의 대부(代父)였다. 함경북도 경원 출신으로 9살 무렵 두만강 일대에 닥친 심각한 대기근과 흉년을 피해 국경을 넘은 가족을 따라 연해주에 정착했다. 하급선원과 노동자 생활을 거쳐 사업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며 러일전쟁의 특수 속에 막대한 부를 일궜고, 그 부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어려운 이웃 동포들을 위해 아낌없이 던진 러시아 한인사회의 거목(巨木)이었다.
그 지역 한인들의 선생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었다. 집집마다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그를 극한의 겨울 추위를 녹여 주는 ‘페치카(러시아식 난로)’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선생은 1908년 안중근 등과 의병본부를 만들어 상당액의 군자금을 댔다. 이듬해 안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러 갈 때까지 사격 연습을 한 곳도 선생의 집이었다. 일제는 연해주에 괴뢰정부를 세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던 한민족 독립운동의 아버지 최재형을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1920년 4월 체포해 총살했다.
최재형과 인천의 인연은 1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2019년 시작됐다. 그의 4대손인 초이 일리야 세르게예비치(당시 17세)군이 그해 9월 인천대학교 어학원에 입학하면서다.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이 모스크바에 있던 일리야 군의 소식을 듣고 “인천대로 데려와 국비장학생으로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성사됐다. 일리야 군은 학업에 정진하던 중 2021년 3월 신장수술을 받았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시와 가톨릭대성모병원이 나서 치료를 전담했다. 많은 시민들도 힘을 보탰다.
인천대와 일리야 군의 만남은 선생의 후손들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뿌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연해주 일대 한인 17만7천여 명은 1930년대 중반 스탈린에 의해 생면부지의 척박한 땅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차디찬 기차 안에서, 삭막한 황무지의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2천여 명은 ‘일제의 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도 이 대열에 있었고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도 이때 중앙아시아, 모스크바 등 러시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총살되고,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던 와중에 최재형 선생을 기억하는 후손들은 거의 없었다. 일리야 군은 입학에 즈음해 국내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상이 한국 출신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뿌리에 대해 열심히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는 지난 4월 ‘제6회 최재형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는 연구소가 선생의 삶을 기리고 선생이 실천한 ‘페치카 정신(나눔·희생·봉사·애국)’을 널리 선양했다고 평가했다.
선생과 고려인들의 160년 역사를 볼 수 있는 특별전시회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에서 26일까지 열린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삶과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과 항일 의지를 꿋꿋이 지켜온 고려인의 역사를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마련한 행사다.
20여 일 뒤면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자녀들과 함께 전시장을 찾아 100여 년 전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육신을 초개같이 던지며 치열한 삶을 살다 간 ‘페치카’ 최재형 선생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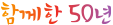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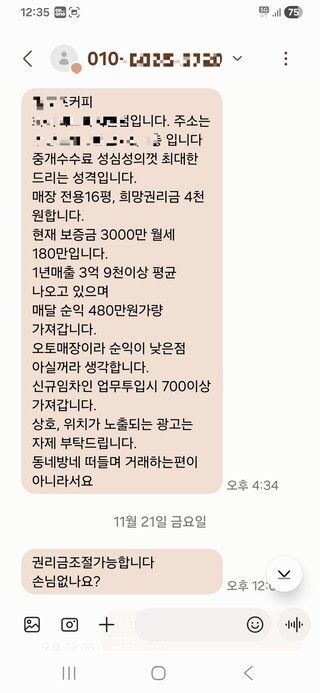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