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다리(橋)를 마주한다. 직접 건너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한다. 실개천에 놓인 징검다리, 강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오래된 다리, 새로운 다리, 돌다리, 나무다리, 쇠다리. 그 장대함과 아름다움, 역사성으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다리는 책과 영화, 노래, 그림 등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곤 한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보스니아 출신 작가 이보 안드리치에게 1961년 노벨문학상을 안겨 준 작품이다. 오스만투르크(이슬람) 점령 이후 다리 주변 마을과 발칸 지역의 400년 역사를 오롯이 담은 대서사시다. 원 이름은 ‘메흐메트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다. ‘콰이강의 다리’, ‘원한의 도곡리 다리’는 각각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유명하다. 공수부대원들의 낙하산 투하 장면이 압권인 ‘머나먼 다리’는 2차 대전 막바지 종전을 앞당기기 위한 연합군의 대규모 작전을 그렸고 ‘매디슨카운티의 다리’, ‘퐁네프의 다리’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인천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다리가 있다. 제3연륙교다. 건립할 때부터 개통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팔자 한 번 기구하다’고나 해야 할까?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2020년 12월 22일 첫 삽을 떴다. 착공까지는 무려 14년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영종,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맺은 손실보전 협약이 발목을 잡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업비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다. 다리 개통은 오는 12월 말이다. 5개월도 안 남았다. 그런데 여태 통행료가 확정되지도, 다리 이름이 결정되지도 않았다.
통행료는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행료가 결정되고 손실보전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의 차이는 천문학적이다. 당연히 정부와의 협의에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영종·청라 주민들은 통행 횟수에 상관없이 주민들에 한해 무료를, 인천시민사회도 법률적 근거를 내세우며 전면 무료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름 제정을 둘러싼 상황은 더 답답하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7월 28일 심의를 거쳐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발표했다.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의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즉각 반발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영종 주민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합당한 명칭이 부여되도록 끝까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도 가세했다. 그러자 청라 주민들도 ‘하늘’자를 빼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재심의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 결과에 대한 이의가 또 제기될 경우 사안은 국가지명위원회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심의 관례상 해를 넘길 공산이 커진다. 이름 없이 개통해야 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다리 이름을 둘러싼 갈등은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주민들의 힘겨루기에 지역 정치인들은 조정이나 중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로 기름을 부었다.
통행료는 어떤 식으로든 개통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명칭은 현재 영종, 청라 두 지역의 감정 상태나 정서를 감안할 때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 제기가 나올 공산이 크다. 두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이름을 짓든가, 그렇지 않다면 영종 쪽 입구에는 ‘영종대교’, 청라 쪽 입구에는 ‘청라대교’라는 푯말을 각기 세워 놓고 그렇게 부르며 개통하는 것밖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하다.
부질없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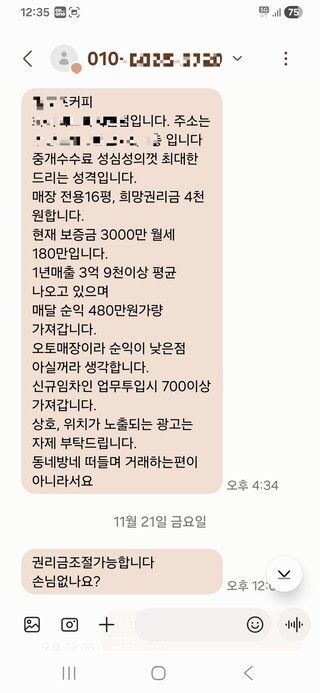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