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과고독,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에 가장 궁색한 백성들로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정치를 행하고 어짊을 베풀 때 반드시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문왕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왕도(王道)입니다.” 제(齊) 선왕이 왕도정치에 대해 묻자 맹자가 한 대답이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늙어서 아내 또는 남편을 잃은 남자와 여자,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아이,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등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였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국가적 관심과 배려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부터 있어 왔음을 위의 글은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은 동서양 모두 비슷했다. 노인이나 고아, 어린이 등에 대한 구제(救濟)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정책의 최우선순위였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왔음을 여러 기록들은 전하고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 역시 즉위교서를 통해 “환과고독은 왕정으로서 먼저 할 바이며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조선왕조실록 1392년 7월 18일)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그 시대 내내 이어졌다.
애민군주 정조는 흉년에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인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제정했다. 4~10세의 행걸아(行乞兒)와 3세 이하 유기아(遺棄兒)를 대상으로 한 이 전칙은 “진휼청에서 옷을 주고 병을 고쳐준다”, “날마다 1인당 정해진 양의 쌀과 간장, 미역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9개 절목(節目)으로 구성돼 있다.
평생을 전장에서 살다시피한 칭기즈칸은 싸움터에서 어버이나 남편을 잃은 고아, 미망인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 시발은 지금으로부터 1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은 극심한 불황 속에 사회주의 등 반체제 세력이 급속히 퍼졌다. 그러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해 의료보험(1883), 산업재해보험(1884), 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보험(1889) 등 3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했다. 비록 정치적 의도가 강한 정책으로 결과는 비참했지만 그 의미는 남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에도 환과고독은 도처에 있다. 경제적 불균등 심화, 분쟁과 전쟁, 삶의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과거보다 이들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과 노인들의 급속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자의 또는 타의이거나 자의반 타의반의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위험’으로 규정했다.
인천의 1인 가구 증가세는 가파르다. 2020년 32만4천841가구에서 2024년 41만1천532가구로 4년 사이 8만6천691가구가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20~34세) 1인 가구는 8만320가구에서 10만2천616가구, 85세 이상은 7천961가구에서 1만2천693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1인 가구의 확산은 인간관계의 단절, 심리적 질환, 범죄, 고독사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면서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건강성을 해치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외로움 전담팀(TF)’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현재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드러난 현상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자리한 근본 원인의 진단과 대책은 더욱 중요하다. TF가 세심히 살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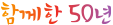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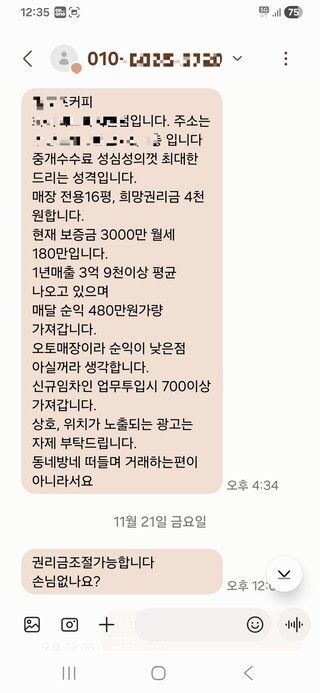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