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여 아시나이까 모르시나이까, 어머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가문이 금방 다 무너지고,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중략)⋯이 아들 낳고 부모님 기뻐하시고, 쉴 새 없이 만지시고 기르셨지요. 하늘 같은 그 은혜 꼭 갚으렸더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리도 못 돼 버려⋯.”
1801년 신유박해로 귀양길에 오른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충주 부근 하담(荷潭)의 선영에 들러 부모의 묘 앞에서 쏟아낸 피울음이다. 사방 도처에 정적들이 칼부리를 겨누고 있던 터, 그가 다시는 살아서 이곳에 올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쓴 이 시의 애절함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유배형을 가기 전 집안의 사당과 조상 묘를 꼭 찾았다. 평상시에도 지극정성이었지만 언제 돌아올지, 혹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유배길에는 빼놓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래의 관혼상제(冠婚喪祭) 가운데 가장 중요시된 의식은 단연 제례일 것이다. 조선은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의 사회였다. 해마다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 철 따라 1년에 4번 지내는 시제, 무덤 앞의 묘제, 명절이나 생일 때의 다례 등이 있었다. 제사 전날에는 재계를 이유로 가급적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고 제삿날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조선 중기 문신관료인 미암 유희춘(1513~1577)은 일기에 “제사가 있는 날이면 항상 이틀 전부터 육식을 하지 않고 물에 만 밥에 오이, 생강, 김치를 먹으면서 소식을 했고 하루 전에는 부인과 떨어져 밖에 나가 잠을 잤다. 특별히 목욕을 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쇄미록(瑣尾錄)」은 오희문(1539~1613)이 1591년부터 1601년까지 9년 3개월간 꼬박 써 내려간 일기로 보물 1096호다. 책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와중에도 1년에 20여 차례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전한다.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며칠 뒤면 추석이다. 명절을 보내는 풍속이 예전 같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근근이 그 명맥이 유지돼 온 성묘 방식마저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코로나19가 한창 전국을 강타하던 2020년 추석 ‘온라인 성묘’라는 낯선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인천에서였다. 기술의 발전, 온라인 환경의 변화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력히 요구됐던 당시 분위기가 결합해 탄생한 것이다.
고인이 모셔진 시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고인의 사진이나 추모글, 생전 영상, 목소리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이용할 때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헌화, 촛불 등 다양한 방식의 성묘가 가능하다. 제사상 차림과 절차 자동 세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인천은 설과 추석 등 명절뿐 아니라 연중 운영 중이다. 원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성묘가 처음 선보였을 때 일부 가정에서 부모·자식 간에 성묘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존 제사와 성묘를 ‘비효율, 형식적’이라는 젊은 세대와 온라인 성묘가 ‘무성의’하다는 기성세대의 의견이 충돌했지만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의견의 차이’ 수준에 머물렀다.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 글쓴이는 아직까지는 철저한 ‘직접 성묘’ 신봉자다. 그러나 온라인 성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설·추석 때의 이용 통계가 그것을 입증한다. 방식이나 격식이 거침없이 바뀌는 시대, 한번 불기 시작한 트렌드를 어찌 거스를 수 있겠는가. 조상을 진정으로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만은 그 변화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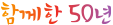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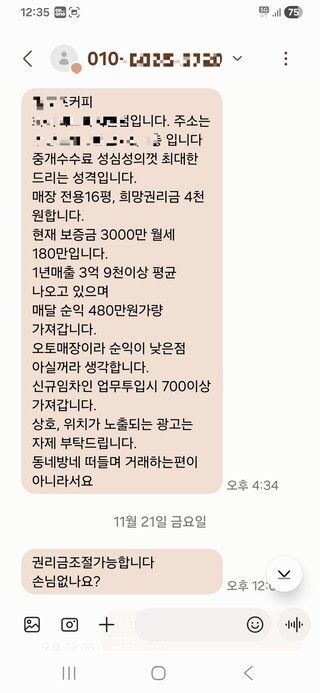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