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도 알고 계십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죽어서 원혼이 되어서라도 위증하고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들에겐...” 1979년 9월 13일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장에 들어선 오휘웅(34)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74년 12월 30일 밤 10시 40분, 인천시 중구 신흥시장의 한 쌀가게에서 30대 가장과 어린 두 자녀가 숨진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는 물론 이후 수사·재판과정,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쌀가게 여주인과 함께 용의자로 체포된 오휘웅은 당초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가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끝까지 그에 대한 최초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다시 주목받은 것은 1986년 조갑제가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면서다. 그는 책에서 강압수사, 진술 외의 증거 부재, 사법판단의 기준, 재심제도의 문제 등을 치밀하게 파헤치며 그 판결이 정당했는가를 묻고 있다. 책은 2015년 재출간됐다. 이어 얼마전 SBS도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TV를 보던 중 깜짝 놀랐다. 방송사는 ‘지금은 은퇴하신 박근원 사진기자가 찍은’이라는 설명과 함께 50년 전 그때의 현장검증 사진을 보여주었다. 당시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던 원본으로, 둘도 없는 귀중한 역사자료나 다름없었다. 박근원씨는 1970~80년대 인천에서 유명했던 사진기자로 “소방관보다 화재현장에 늘 먼저 와 있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였다. 기자와는 1988년 창간한 인천일보에서 한동안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개항장 인천은 언론 분야에서도 타 도시들을 압도했다. 1890년 인천경성격주상보(월 2회 발행)가 발행됐다. 이 신문은 조선순보(1891), 조선신보(1892), 조선신문(1908)으로 제호가 변경되면서 1919년 본사를 서울로 옮긴 뒤 1941년 2월 폐간 때까지 명맥을 이어갔다. 1904년 3월에는 국한문혼용 대한일보가 창간됐다. 비록 일본인들이 그들을 위해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후에도 광복 전까지 여러 신문들이 발간됐고 조선, 동아 등 우리 신문들의 지사나 지국 운영도 왕성하게 이뤄졌다.
1945년 10월 8일 탄생한 대중일보는 우리 손으로 만든 인천 최초의 국문신문이다. 인천 지역언론의 출발점이라는 막중한 의미가 이 날짜에 담겨 있다. 여러 차례 제호가 바뀌다가 1973년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명맥을 다했다. 이후 숱한 신문들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부침 속에 인천 언론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얼마전 창사 50주년을 맞은 기호일보와의 대담에서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신문사료관이나 인천신문박물관 건립을 고민해볼 때라는 질문에 의미 있는 대답을 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인천언론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대중일보 호외와 인천일보 시제판, 경기교육신보 창간호를 비롯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언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 사료가 없으면 기억도 사라지기 마련인만큼 인천의 언론을 기억하고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40년 가까운 언론사 근무 기간 인천에 큰 관심을 갖고 간간이 인천 관련 글을 써온 기자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어느덧 80년이다. ‘인천언론사료관’ 같은 공간 하나는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언론사와 관련 단체, 지방정부, 학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인천 역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도 시급하다. 민간에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소장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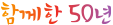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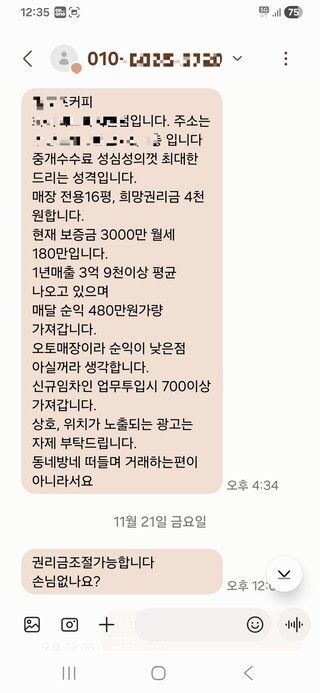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