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인천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가 생산된 지는 60여 년이지만 그 연원은 훨씬 깊다. 일제는 1937년 부평 산곡동에 군용 지프 생산을 위한 ‘국산자동차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2년 뒤에는 인근에 디젤자동차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일본인 근로자 사택도 지었다. 2차대전 패망으로 출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채 폐쇄됐다.
1955년, ‘국내 최초’의 승용차 ‘시발(SHIVAL’)이 부평공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미군 지프의 부품을 재생해 엔진 등을 만들고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얹은 조악한 형태였으나 당시 국민들에게는 무척이나 신기한 제품이었고 차가 지나가면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렸다고 기록은 전한다. 1960년대는 자동차산업의 융성기였다. 제조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신진공업사(대우차 전신), 하동환자동차제작소(쌍용차 전신) 등 30여 곳에 달했다.
제대로 된 ‘승용차 꼴’을 갖춘 새나라자동차가 1962년 부평서 출고됐으나 1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부산의 신진자동차가 1965년 새나라를 인수한 뒤 1천600cc급 ‘코로나’ ‘크라운’ 등을 생산하며 국내 최대 메이커로 부상했다. 1972년 GM과 합작으로 GMK를 설립했으나 원가, 로열티 부담 등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다 1976년 산업은행으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상호도 새한자동차로 바뀌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김우중(金宇中)이다. 새한자동차 사장에 취임한 김우중은 1982년 회사명을 대우자동차로 변경했고 4년 뒤 세계차를 표방하며 심혈을 기울여온 ‘르망’ 생산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브랜드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1997년 몰아친 금융위기로 대우그룹 자체가 해체되며 자동차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결국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됐고 2002년 GM에 인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 철수설이 재점화하면서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전국 9곳의 직영서비스센터 운영을 내년 2월 15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발단이 됐다. 사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환경에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급기야 지난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직영정비소 폐쇄는 국내 제조와 정비, 물류기반을 한꺼번에 흔드는 것으로 사실상 철수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면서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 등 관련 단체와 민주당 인천시당도 가세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인천의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한국지엠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협력업체 밀집지역인 인천의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현재 한국지엠을 둘러싼 여건은 만만치 않다. 새로 관세가 부과된 미국 수출량이 적지 않게 줄었고 국내 판매량도 전년보다 무려 40%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NDC)도 큰 부담이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송부문의 경우 신차 10대 중 7대를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인데, 한국지엠은 무공해차 생산라인이 아예 없다. 단계적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한국지엠이 지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 비춰 면밀하고 신중한 분석,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때인 2018년식의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GM이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한국 사업장에 대해 어떤 중장기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기침 소리에 놀라 먼저 약부터 주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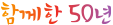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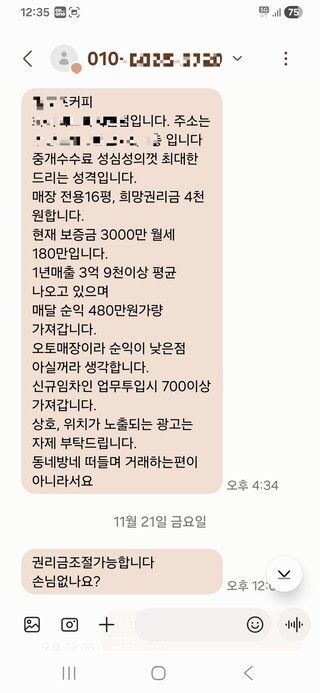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국제교류 초석 다지는 경기도교육청](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557_504958_2116_1763882478_220.jpg)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너른강 수업나눔 한마당](https://cdn.kihoilbo.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04298_504725_5949_1763621990_220.jpg)
